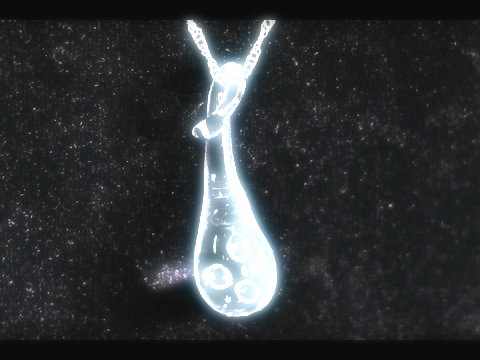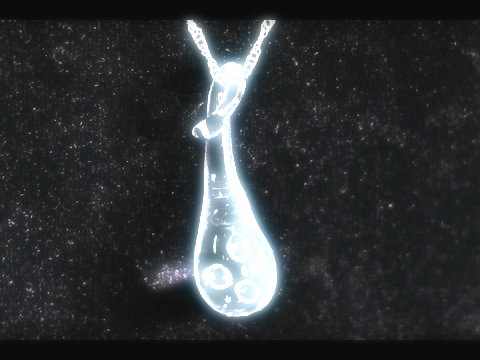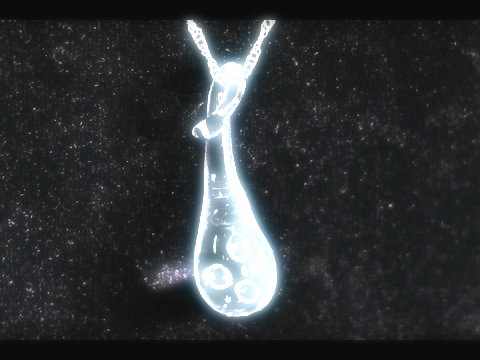
- 47일 째 -
이것은 고요하면서도 소란스러운, 그리고 편안한 듯하면서도 어지러운 상당히 희한한 꿈이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밤이 돌아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면 잃어버렸던 기억이 돌아온다.
나는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지난 47일 동안 매일 겪어왔다.
…
…
…
"HI, DARLING─."
캄캄한 어둠속에서 누군가의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머리 위에 두 개의 뿔이 솟아 있고, 등에는 커다란 날개가 뻗쳐 있는 악마다.
"난 네 DARLING이 아냐."
"알잖아, 내가 모든 여자를 그렇게 부르는 거."
"진심으로 기분나쁘니까 그만 둬. 당최 너는 어째서 매일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왜 하필이면 나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내 친구냐고."
"그는 내 그릇이야. 비록 꿈속이긴 하지만 인간에게 내 모습을 보이려면 누구든 그와 같은 인간을 한 명을 택해야 해. 내게는 이게 가장 친숙한 인간의 모습이고."
이 악마가 내 꿈에 나타날 때면, 그는 언제나 지금처럼 카라마츠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얼굴도, 목소리도, 체형도, 거의 모든 것이 똑같다. 다만 인간의 몸을 빌리거나 그의 모습을 베끼는 악마들이 다 그렇듯 표정이나 눈빛, 말투, 행동 등이 다를 뿐이다.
"너와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어."
"자기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고 잘도 그런 말을 하네."
"나중에 내키면 가르쳐줄게. 당분간은 계속 스케줄러라고 불러줘."
악마들은 무엇이든지 파헤치고 까발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자신에 대한 것 만큼은 철저하게 숨기려 한다. 그것이 사적인 것이든, 이름처럼 사소한 것이든. 그런 은둔성 때문인지 그들 사이에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완전히 마음을 여는 것과 같은 것으로 통한다. 그래서 대부분 서로를 직급이나 별명 등으로 부르는 것이다.
"나, 원…"
나는 콧방귀를 뀌며 두어걸음 장소를 옮겨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차피 사방이 어둠 뿐이라 어디에 의지하던 마찬가지였다.
무릎에 팔꿈치를 올려 턱을 괴고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노라면 스케줄러가 날아와 내 옆자리를 채운다. 그는 늘 이런 식이다.
"내가 이름 안 가르쳐줘서 삐쳤어?"
"그냥 분한 것 뿐이야. 너만 알고 나만 모른다는 게. 너는 나와 만나기 전부터 내 이름을 알고 있었잖아, 이 망할 스케줄러놈아."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모처럼 만났는데 쓸데없는 밀당으로 시간낭비하지 말자. 밤은 그다지 길지 않아."
착─!
"아얏…" 그가 내게 얻어맞은 손등을 가슴앞으로 가져가며 아픔을 호소한다.
아무렇지 않게 들러붙으려고 하니까 항상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다.
"농담이야, 농담. 오늘 난 네 죽음에 대해 얘기하러 왔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는 무심코 입을 다물어버렸다. 자신이 상당히 비참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표정관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제 이틀만 더 기다리면 네 영혼은 내 것이 돼." 그가 날카로운 이빨을 살짝 드러내며 말하고는 마른 입술을 슥 핥았다.
49일 안에 눈물을 세 방울 모으면 삶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 . . 하지만 그 기회는 공짜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실패하게 되면 내 영혼은 지옥의 악마들에게로 귀속된다. 그리고 머지않아 나도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
스케줄러가 지금 이토록 흥분하는 이유는 딱히 내 영혼에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는 나와 같은, 한때 천사였던 자들의 영혼을 좋아한다. 타락시키는 즐거움이 있다나 뭐라나. 하여간 성격 만큼이나 취미도 더럽게 고약한 녀석이다.
"기대하고 있을게. 물론 내가 직접 마중나갈 거야."
"……."
악마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영락없이 못된 장난의 표적이 되고만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가라앉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죽음', '삶의 마지막'이니까.
"그러게 신과 그런 터무니없는 약속은 하지 말았어야지. 한 번 잃어버린 삶을 되찾길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
"딱히 더 살고 싶어서 약속했던 거 아냐."
"그럼?"
"확인하고 싶었어.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자신이 그 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최초에 눈을 감기 전,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기 전. 내가 했던 생각은 오로지 그것 뿐이었다.
분주히 움직이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점점 간격을 좁혀가는 심장박동기의 소리. 그 안에서 나는. . . .
'살고 싶다'가 아닌, '이것이 외로운 죽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친구의 손을 한 번 잡아보고 싶었다.
어린시절부터 줄곧 간직해온 따뜻한 체온을.
"인간은 모두 위선적이야. 타인을 위한 진실 된 눈물 따위 녀석들에게 기대하면 안 된다고."
"설령 이대로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친구들을 탓하지 않아."
"말 한 번 잘 하네. 속으로는 정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주제─."
"시끄러워… 남의 마음을 멋대로 읽지 마."
설령 상대가 교활한 악마라 할지라도 자신의 어두운 이면은 내보이고 싶지 않다. '실은 납득할 수가 없고, 원망스럽고, 미워.' 그런 생각 따위────. 스스로에게도 부끄럽다.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
…
…
▶
|